벌써 오래전 이야기이다. 리포트를 정말 잘 쓴 학생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인터넷 글을 적당히 복사해 온 것이었다. 좋은 학점을 받지 못한 그 학생은 뒤이어 항의해 왔다. 다른 사람의 글이라 해도 자신은 깊이 공감하였고 그것을 옮기는 사이에 정말 많이 배웠다며, 그렇게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나아가 대학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물어온 적이 있다. 그렇다, 지식이 곳곳에 널린 이 시대에 대학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

<코로나19로 ‘대학’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대학을 가지도 안 가지도 않는 상황이 이어지자, 문득 이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에 간다고 답한다면 모범 답안은 될 것이다. 하지만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세상에는 분명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하다. 적지 않은 대학이 곧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그중의 하나로, 너무 많이 듣다 보니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오늘의 대학이 ‘위기’라는 단어와 늘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원래 기능보다는 위태로움의 이미지로 각인이 되어 버린 것 같다. 하지만, 내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위기의 대학에 간다, 이것은 쉬기 위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집에 간다는 것만큼이나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가.
코로나19로 무르익은 대학의 디지털 전환
비용 절감이 절실한 위기의 대학들은 요사이 경영에서 화두라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현실 공간의 학교를 온라인으로 옮기자는 것이다. 캠퍼스 개념이 무너지고 학기나 시수 같은 시간제한을 없앤 미네르바 스쿨, 에꼴42 등의 새로운 고등교육 형태가 해외에서 요 몇 년 줄지어 나오기도 했다. 교육부는 구조조정의 검을 꺼내 들었고 대학들은 고개를 주억거렸지만, 국내에서 진정한 변화는 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라는 것을 대학마다 1년여 진행하다 보니, 대학의 디지털 전환 논의가 갑자기 무르익은 듯한 분위기이다. 이러다 정말 한국에서도 대학이 급변할 것 같다.
2011년 이래 한국에서는 대학 반값 등록금 요구가 있었는데,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모일 기회가 없어 현재는 소강상태로 보이지만, 이 불씨는 언제든 되살아날 것이다. 사람들에게 대학은 멋진 건물이나 학사모로 상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학이라는 요건이 성립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학생과 교수이다. 전쟁 중의 피난살이에서도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들이 다 무너진 순간에도 다행히 이 두 요소가 버티며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당장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대학은 온라인공개수업(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등을 활용하여 조속히 디지털 전환을 시도할 것이다. 인건비를 아끼고, 건물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지식 전수만이 대학의 목적일까?
그런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대학에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표면적인 모습의 대학은 클라우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학생도 해외에 있는 학생도 다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학기, 학년, 시수 등의 시간제한도 과감하게 깰 수 있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 자체의 쓸모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지식 전수만을 위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라는 점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디지털 전환이 꿈꾸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는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과거’가 가르치고, ‘미래’가 배우는 형국인 한국의 대학은 이 점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1996년 OECD 정식 회원국이 되면서, 선진국 진입의 테이프를 끊었다. G7 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초대받아 참석하는 시대를 사는 지금의 한국 아이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나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중이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개도국이나 후진국 한국에서 태어나, 다른 선진국으로부터 배우려고 어린 시절부터 발버둥 쳤던 세대에 속한다. 대학에서 국어나 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마저도 유학 간다는 우스갯소리, 자신은 한국의 대학에서 가르치지만 자기 자식은 반드시 외국에 유학 보낸다는 소리는, 씁쓸하지만 마주해야 할 한국 고등교육의 현주소였다. 어쩔 수 없이 ‘선진국 바라기’들이 지금 한국의 대학 강단에 있는 다수이지만, 이들로부터 배우고 있는 아이들은 이미 글로벌 표준을 따르고 있으며, 이 표준은 인터넷에서 클릭만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
디지털 전환 성공 대학들로부터 진정 배워야 할 점
최근 가장 혁신적인 대학으로 손꼽히고 있는 애리조나 주립대학, MIT, 하버드 의과 대학, 뱁슨 칼리지 등은 디지털 혁신에 성공한 대학이기도 하다.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대학들로부터 진정 배워야 할 점은, 이들 학교가 지식 전수에 어떻게 성공하였느냐가 아니다. 인간이라는 쓸모를 자신들의 학생이 발견할 수 있도록, 대학이 스스로 어떻게 변화하였냐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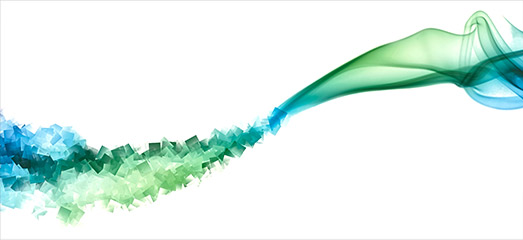
<디지털 전환은 대학 어려움 타개를 위한 마법이 아니다.>
대학에서 다른 사람의 것으로 리포트를 쓰면 왜 문제가 되는가. 거기에는 멋진 결과물은 있되, 나 자신을 쓸모 있는 인간으로 세우는 과정이 빠져 있다. 디지털 전환은 그 자체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대학이 처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마법이 아니다. 대학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두 요소, 그중에서도 학생을 정중앙에 놓고 기획하여야만 디지털 전환은 의미가 있다. 인간이라는 쓸모는, 결코 하나의 정답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절차탁마(切磋琢磨)를 통하여, 누구든지 부단히 자신을 갈고닦으며 묻고 답하는 과정을 평생 궁구해 나가야 한다. 결과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인간의 끝을 알 수 없는 가능성을 향하여, 대학은 길을 열어줄 따름이다.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디지털 전환은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변지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